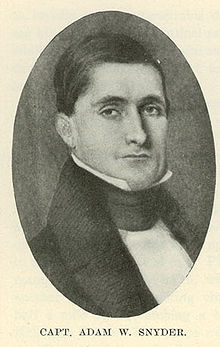혀지도
Tongue map혀지도나 맛지도는 혀의 다른 부분이 다른 기본 취향을 전담한다는 일반적인 오해다.그것은 혀의 도식화된 지도로 묘사되어 있으며, 혀의 특정 부분은 각각의 맛에 맞게 라벨이 붙어 있다.비록 학교에서 널리 가르쳤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나중에 연구함으로써 반증되었다; 비록 다른 부분이 특정한 취향에 더 민감하지만, 모든 미각은 혀의 모든 영역에서 나온다.[1]
역사
이 지도 뒤의 이론은 하버드 심리학자 더크 P가 쓴 논문에서 비롯되었다. 헤닉은 1901년에 쓰여진 독일어 논문의 번역본인 주르 사이코필식 데 게슈맥신네스를 번역한 것이다.[2]전자의 논문에 있는 자료의 애매한 표현은 혀의 각 부분이 정확히 하나의 기본 맛을 낸다는 것을 시사했다.[3][4]
논문은 혀 전체에서 문턱 감지 수준의 미세한 차이를 보였지만,[5] 이러한 차이는 나중에 문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문지방 민감도의 미세한 차이는 감각의 차이로 교과서에서 잘못 해석되었다.[6]
혀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먼저 맛을 감지할 수 있지만, 모든 부분은 모든 맛의 조건을 똑같이 전달할 수 있다.문턱 감도는 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감각의 강도는 그렇지 않다.[6]
같은 논문에는 '맛띠'를 보여주는 맛봉오리 분포도가 포함됐다.[7]
1974년 버지니아 콜링스는 이 주제를 다시 조사했고, 모든 맛이 혀의 모든 부분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8]
맛 벨트
이 신화를 촉발시킨 잘못 해석된 도표는 인간의 미뢰가 혀 안쪽을 따라 '맛띠'로 분포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A.호프만은 1875년 인간 혀의 등심부에 사실상 균질유두와 미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9] 이 도표가 설명하는 것은 이 발견이었다.
참조
- ^ O'Connor, Anahad (November 10, 2008). "The Claim: The tongue is mapped into four areas of tast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June 24, 2011.
- ^ Hänig, David (1901). "Zur Psychophysik des Geschmackssinnes". Philosophische Studien. 17: 576–623. Retrieved July 9, 2014.
- ^ Wanjek, Christopher (August 29, 2006). "The Tongue Map: Tasteless Myth Debunked". Livescience.com. Retrieved June 24, 2011.
- ^ David V. Smith; Robert F. Margolskee (March 2001). "The Taste Map: All Wrong". Scientific American.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March 19, 2011.
- ^ Jacob M. Andersen (Jan 2015). "Mythbusting The Tongue Map". ASDA.
- ^ a b Chemotic Organization of Taste wwwalt.med-rz.uni-sb.de, 2011년 7월 18일 웨이백 머신에 보관
- ^ Hahnig(1984)에 따르면 인간의 혀에 대한 화학적 표현 wwwalt.med-rz.uni-sb.de 2011년 7월 18일 웨이백머신에 보관됨
- ^ Collings, V. B. (1974). "Human Taste Response as a Function of Locus of Stimulation on the Tongue and Soft Palate". Perception & Psychophysics. 16: 169–174. doi:10.3758/bf03203270.
- ^ Hoffmann, A. (1875). "Über die Verbreitung der Geschmacksknospen beim Menschen" [On the spread of taste buds in humans]. Archiv für Pathologische Anatomie und Physiologie und für Klinische Medicin (in German). 62 (4): 516–530. doi:10.1007/bf01928657. S2CID 38066242.